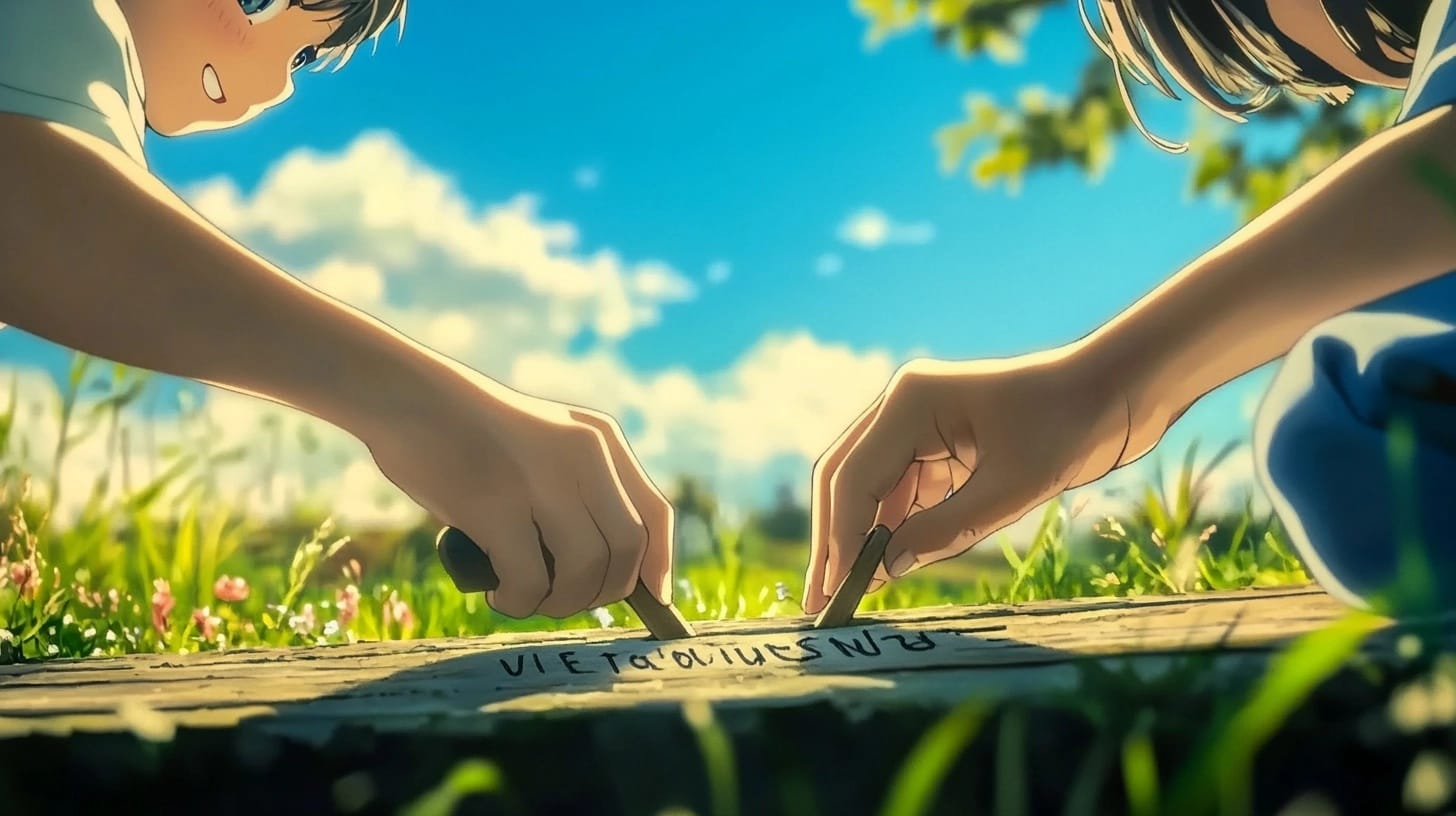햇살이 쏟아지는 운동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둥실 떠다녔고,
나뭇잎은 선선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재하는 체육복을 단정히 입고 한쪽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책장이 천천히 넘어갔다.
축구공이 구르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시끌벅적한 함성이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오로지 활자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운재하! 여기서 뭐 해?"
맑은 목소리가 그를 부르며 다가왔다.
책에서 고개를 든 순간, 해솔이 눈앞에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솔의 얼굴 위로 가늘고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났다.
"넌 왜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재하는 어색하게 책을 덮었다.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그러나 해솔은 그 대답을 만족하지 않았다.
해솔은 씩 웃더니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의 잔디는 해솔의 움직임에 따라 바스락거리며 속삭였다.
"그럼 내가 너랑 가만히 있어 줄게!"
그 말과 함께 해솔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재하는 해솔의 이런 행동이 낯설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해솔과 함께 있을 때면 그 적막함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해솔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재하를 끌고 다녔다.
매점에 가자고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자며 등을 떠밀었다.
심지어 방과 후에는 재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 빨리 와!"
"어디 가는데?"
"그냥 와라. 가 보면 알아!"
그렇게 끌려간 곳은 마을 뒤편 작은 개울가였다.
주변에는 키 큰 갈대가 바람에 살랑이고,
개울물은 투명하게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해솔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개울가 돌 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건너갔다.
작은 물고기들이 해솔의 발밑을 스치듯 헤엄쳤다.
재하는 망설였지만, 해솔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결국 신발을 벗고 따라 나섰다.
"봐봐! 물 되게 시원해! 너도 담궈. 담구라구!!!"
해솔이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자 재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해솔의 웃음에 묘하게 기분이 풀렸다.
해솔과 함께하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해솔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해솔이 재하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책상 위로 흐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해솔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재하는 조용히 다가가 해솔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소처럼 떠들썩하지 않은 해솔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 순간, 해솔이 눈을 떴다.
"어, 재하야?"
해솔은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다. 재하는 무심한 척 말했다.
"왜 내 자리에서 자고 있어."
"아, 미안. 근데 너 자리 진짜 편하다? 앞으로 여기서 잘까?"
그 말에 재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석양빛에 붉게 빛났다.
그날 저녁, 해솔과 재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퍼뜨렸다.
"재하야, 너는 가끔 이런 생각 안 해?"
"어떤?"
"우리 지금은 이렇게 같이다니지만, 언젠가 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
재하는 해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해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따라 해솔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렇게 강해솔이라는 태풍이 재하의 삶을 휘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차갑거나 거칠지 않다는 것을, 재하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