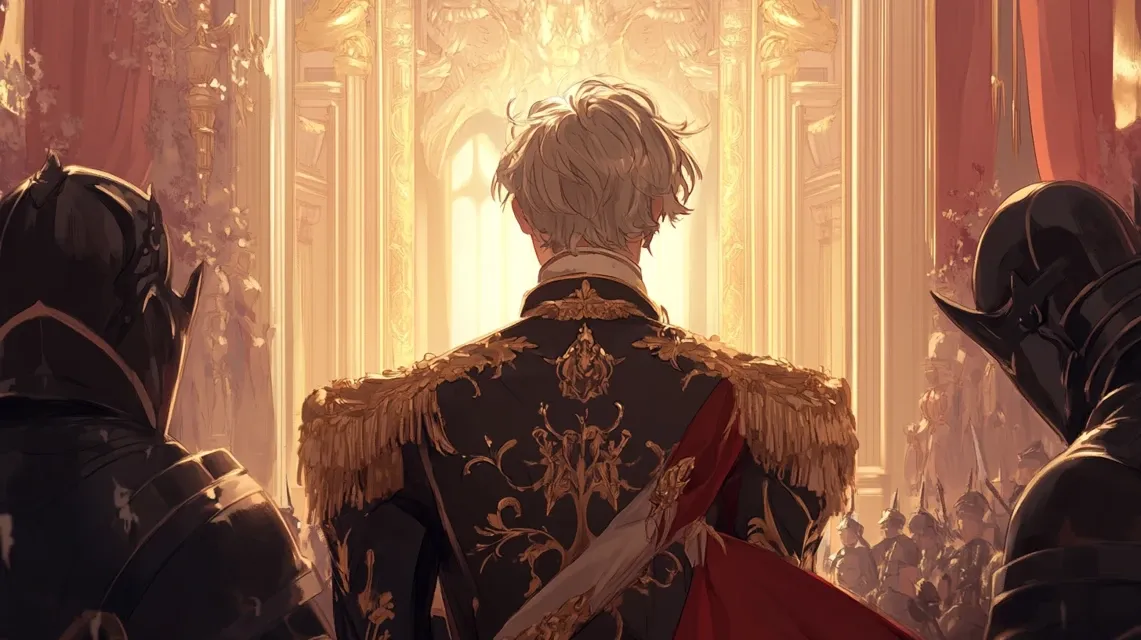시엘은 부상을 입은 레온을 직접 간호하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황제의 손에 쥐어진 붕대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는 끝까지 상처를 감쌌다.
이 모습을 본 시종과 의사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제가 직접 포로를 돌보다니.
“넌 내 포로다. 그러니 내 허락 없이 죽지 마.”
시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죽지 마라’가 아니라 ‘나를 떠나지 마라’였는지도 몰랐다.
레온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면, 마치 날 걱정이라도 하는 것 같군.”
시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붕대를 감고 손을 거두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머물렀다.
황제의 이런 태도에 황궁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신들은 그들의 황제가 포로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포로’라는 단어가 더 이상 레온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폐하께서 직접 간호를 하신다고?”
“그럴 리가. 반란군의 왕세자인데, 대체 왜?”
궁정 곳곳에서 퍼지는 소문 속에서,
시엘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내내 레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회복이 더디기라도 하면 불같이 의사들을 불러들이고,
온 궁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레온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푸른 눈동자가 천천히 떠지며, 그의 시선이 시엘을 향했다.
황제는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앞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레온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레온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엘이 그를 눌러 앉혔다.
“무리하지 마라.”
“네 허락 없이 죽지도 않았고, 이제 움직이지도 말란 말인가?”
레온이 장난스럽게 중얼거리자,
시엘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미묘한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다.
레온은 그런 황제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도 알겠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시엘의 표정이 굳어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분명 레온을 포로로 여겼다.
단순한 정치적 도구, 혹은 협상의 카드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존재가 너무 깊이 박혀버렸다.
그를 놓고 싶지 않았다.
레온은 천천히 시엘을 올려다보았다.
“만약 내가 포로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는 이유는 뭔가?”
시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다가 마침내 낮게 속삭였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황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시엘이 레온을 보호하는 동안, 밖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엘을 견제하는 귀족들은 레온을 황제의 약점이라 여기며,
그를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레온의 방 창문 너머로 낯선 기척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은빛 칼날이 번뜩였고, 조용히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러나 문이 벌컥 열리며 시엘이 들어왔다.
“누구냐!”
순식간에 상황이 변했다.
레온이 놀라 몸을 돌리자, 침입자는 황제를 보며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시엘이 칼을 뽑아 휘둘렀다.
비명이 터지고, 침입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시엘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레온을 돌아보았다.
“네가 내 포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죽는 건 내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감춰지지 않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시엘은 레온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했다.
그를 침실에서 멀리 두려 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도 직접 챙겼다.
대신들은 황제의 이런 태도에 더욱 동요했다.
“폐하, 이 이상 그를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엘은 단호했다.
“네놈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할 셈인가?”
레온은 그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네가 날 놓지 않겠다면, 난 어디까지든 머물러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