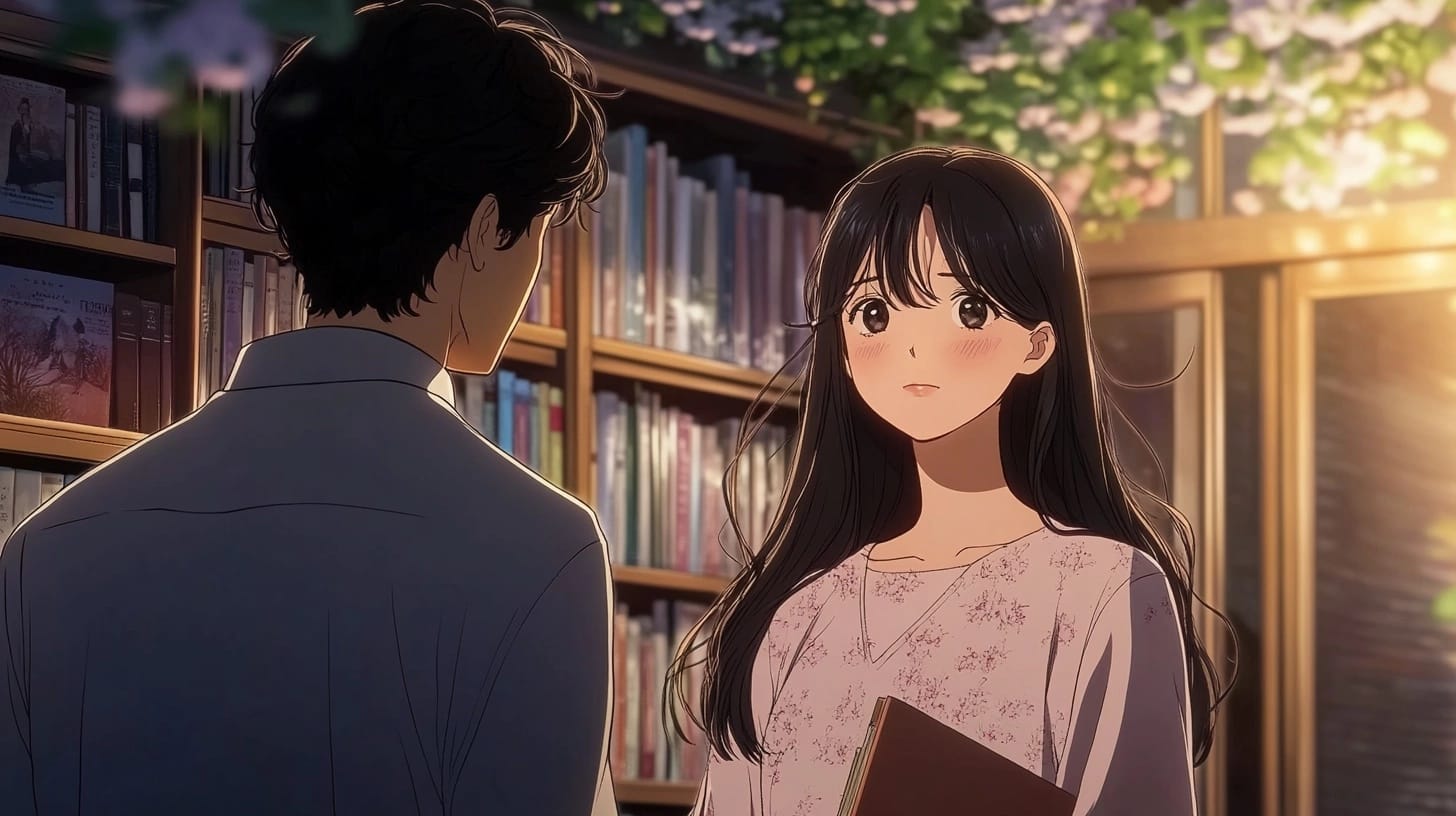수경은 요즘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
하루의 끝에서 문득 떠오르는 목소리. 언제부터였을까.
서지훈과의 시간이 조금씩 그녀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고,
지훈 또한 수경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행복한 순간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지훈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수경은 문득 익숙한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커피 향, 창밖으로 내리는 비, 그리고 맞잡은 두 손.
그건 분명 과거의 기억이었다.
동우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 자신과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서동우가 아니다.
하지만 어째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아니야, 이건 지훈 씨야.’
수경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지훈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수경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감정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수경은 지훈과 함께할수록 동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말투 하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
무심한 듯하지만 가끔 보여주는 다정한 태도까지.
모두 동우와 겹쳐졌다.
어느 날, 지훈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저녁노을이 물든 거리에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 거리, 익숙한데요.”
수경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요?”
“네. 마치… 전에 걸어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의 말에 수경은 한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지훈은 자신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수경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죠. 누구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날 밤, 수경은 혼자 남아 동우와의 지난날을 떠올렸다.
지훈과 함께하며 행복할수록, 동우와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동우와 나눴던 대화, 그가 건넸던 다정한 말, 그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까지.
‘이건 지훈 씨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토록 익숙한 거지….’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훈일까, 아니면 여전히 동우일까.
그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수경은 지훈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이었다.
지훈이 문득 물었다.
“한수경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본 적 있어요?”
수경은 걸음을 멈췄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훈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마치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것처럼.
수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잊고 싶다고 해서 잊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수경은 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감정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든, 자신은 끝까지 이 감정을 마주할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수경은 그의 말에 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동우가 했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사람이 정말 서지훈일까,
아니면 서동우의 잔상이 지훈을 통해 다시 나타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