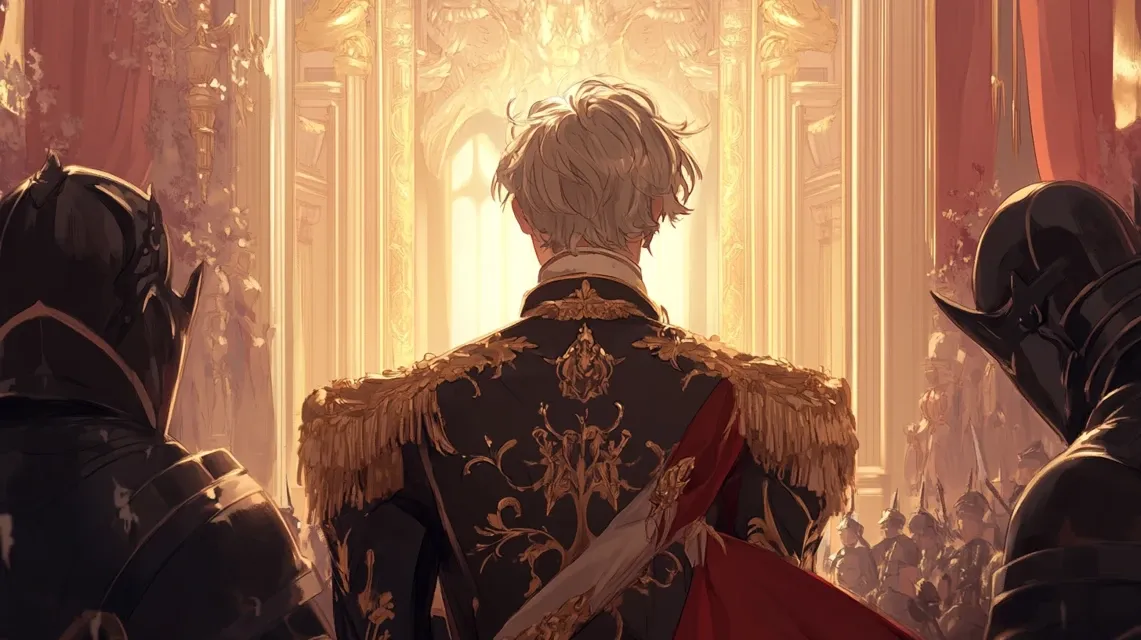전쟁의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반란군과 제국군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고,
결국 양측은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황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시엘은 전장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레온은 황궁의 발코니에서 전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한때 속했던 반란군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왕세자로 여기며, 자신들의 희망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시엘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레온은 천천히 몸을 돌려 황제를 바라보았다.
시엘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냉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나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인가.”
레온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 텐데.”
시엘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다. 네 선택은?”
전장은 곧 피로 물들 것이었다.
그는 반란군의 왕세자로서 다시 그들의 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시엘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그 순간, 적의 깃발이 황궁을 향해 올라갔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온과 시엘은 동시에 발코니 너머를 바라보았다.
“전투가 시작됐군.”
레온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고민할 시간도 없겠어.”
하지만 전장으로 향하려는 순간,
레온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던 감정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도, 갈등도 아닌—
“당신이 나를 속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사로잡혔던 거야.”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시엘에게 끌렸다는 사실을. 그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엘 역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레온을 가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를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시엘은 결단을 내렸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 말에 레온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엘을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나 레온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시엘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전장에서는 병사들의 함성과 함께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비린내가 공기 속에 섞였고, 전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그러나 황궁 안, 이 발코니에서만큼은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레온의 손이 움찔했다. 마음속 깊이 그를 잡아두고 싶었지만,
그의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반란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넌…”
레온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잖아.”
시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레온은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시엘은 결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제 레온이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충성과 의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 향하는 곳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레온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든,
이 순간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시엘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라.”
레온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시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전장은 혼돈에 빠졌지만,
여기, 단 둘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다.